“『무원록(無?錄)』에서는 사유를 알릴 때 반드시 날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또 문안(文案)에는 거년, 금년, 전월, 금월, 당일, 차일 등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생명에 관한 중대사나 주요한 문안에는 연월일 기재를 규칙으로 삼으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세종 1년(1419) 2월 23일
1419년 형조에서 문안을 작성할 때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을 세종에게 건의한다. 인명을 다루며 형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지난해, 올해, 다음날과 같은 막연한 표현들이 사용됨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세종은 형조의 요청대로 연, 월, 일 기재를 규칙으로 삼을 것을 정한다.
조선의 법의학과 과학적 수사법은 세종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된다. 세종 1년(1419)에 이르러서 수사나 검시(檢屍) 보고서를 『무원록』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 조선의 검시 전문성은 그리 높지 않았고, 사건 규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리하여 세종 12년(1430)에서 법을 다루는 율과(律科)의 취재 도서의 하나로 『무원록』을 포함하였으며, 세종 17년(1435)에는 반드시 『무원록』을 시험 보게 한다.
원나라 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은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제목처럼 검시 전문서로 활용되었다. 고려 때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은 조선 초까지 매우 중요한 사건 수사의 지침서였다. 하지만 조선의 사회구조는 중국의 원나라와는 사회적 관행과 사건의 양상이 달랐고, 책의 문장을 정확히 풀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무원록』만으로는 조사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세종은 『무원록』을 취재 과목으로 확정한 1435년 최치운(崔致雲), 이세형(李世衡) 등에게 책에 주석을 달아 해설하도록 명한다. 이들은 명나라에서 중간된 『무원록』을 바탕으로 송나라의 『세원록(洗寃錄)』 『평원록(平寃錄)』 『결안정식(結案程式)』을 참조하여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편찬했다.
세종 20년(1438)에 초판이 간행된 이 책은, 검시의 지침과 함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얽힌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검시 보고서 양식, 상부 기관으로의 보고 방식, 소송 방법, 법률과 형사정책 등도 포함되어 있다. 용례 또한 풍부하다. 검시에 사용되는 은비녀의 진위, 친생(親生)의 혈속(血屬) 판별법, 낮과 밤 구분법, 임신 여인의 주검, 검사한 후의 기록법 등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한편, 『세종실록』 세종 24년(1442) 2월 27일에 따르면 이 시기 「검시규식(檢屍規式)」을 마련했다. 초검관은 서울에서는 각기 그 부서의 관리가 하고 지방에서는 그 소재지 관의 수령(守令)이 하며, 복검관은 서울에서는 한성부 관리가 하고 지방에서는 인근(隣近) 수령이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만약 복검에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3, 4검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의학의 발달은 인권 존중에도 기여했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무원록(無?錄)을 보니, 시체를 검사하는 데에는, 몸에 있는 어느 곳에 상처가 있는데, 길고 넓은 것이 각각 몇 치 몇 푼이요, 깊이가 몇 치 몇 푼이라고 하였사오나, 산 사람(生人)의 상처에 있어서는 깊고 얕은 것을 몇 치라고 재는 법문(法文)이 없사온데, 근년 이래로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으레 사람이 맞아서 상한 것을 살펴 검사할 때에, 상처의 깊고 얕은 것을 자로써 재는데, 사람이 이미 상처를 입어 아픔이 심한데도, 또 자로 깊고 얕은 것을 재느라고 나뭇가지 같은 물건으로 찔러서, 더욱 아프고 상하게 하여 숨이 끊어지게 될까 염려되옵니다. 옛사람의 말한 것이 반드시 깊은 뜻이 있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하물며 율문(律文)에도 상처를 냈으면 일체로 과죄(科罪)한다 하였으니, 반드시 상처의 깊고 얕은 것으로 죄의 경중이 있지 아니한 것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죽은 시체 외에는 맞은 사람의 상처의 깊고 얕은 것은 모두 재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세종 21년(1439) 11월 29일
1439년 세종은 살아있는 사람의 상처 크기와 깊고 얕음을 재지 못하게 한다. 위 기록에 따르면 이 무렵 관리들은 피해자의 상처의 깊고 얕음을 자로 쟀는데 나뭇가지 등을 찔러서 상처의 크기를 측정하고 깊이나 너비를 기록했다. 상처의 정도가 형량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심지어 상처가 덧나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조사관의 편의주의에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의정부의 청을 받아들인 세종은 죽은 사람만 상처의 깊이와 크기를 측정하고, 산 사람은 눈으로만 확인하게 명한다.
이렇듯 세종 때부터 그 기초가 다져진 법의학 덕에 조선 관리는 꽤 선진적 수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신체 손상을 죄악시했던 유교 윤리로 인해 부검을 시행하진 않았으나 나름의 법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부검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여러 사람이 검시를 해 정확도를 높였다. 조사관들은 의견을 모으고, 지침서에 소개된 상처나 시반 등의 사례를 살펴 합리적 해석을 시도했다.
사회가 발달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것과 비례해 조선의 법의학도 진보했다. 영조 24년(1748) 왕의 특명으로 구택규(具宅奎)가 무원록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빼고,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더한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을 집필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 구윤명(具允明)은 누적된 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을 편찬했다. 정조는 이 책을 한문본뿐만 아니라 언해본 즉 한글책으로도 출간했다.
이처럼 『무원록』, 『신주무원록』 『증수무원록』 등으로 발전 계승된 조선의 법의학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서구식 재판제도가 시행될 때까지도 중단되지 않고 참고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살인 옥사에 있어서 복검(覆檢:살인 사건에서 두번째로 시체를 검안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한 번이라도 분명하지 않게 하면 그 결과로 생사가 결판나니 자상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간혹 외방의 수령이 직접 심문하는 것을 기피하여 하리들에게 맡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연줄을 인하여 농간을 부리고 마음대로 죄를 증감하여 옥사가 이리저리 옮겨지면서 수십 년이 되도록 판결이 나지 않아 옥중에서 말라 죽는 지경에 이르니, 이것이 바로 원망과 억울함이 생기는 이유이다. 내가 이에 대하여 심히 측은하게 여기니, 해조로 하여금 여러 도에 지시하여 이제부터는 해당 지방관이 직접 복검하기를 한결같이 『무원록(無?錄)』에 따라 하여 혹시라도 분명하게 다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라.”
하였다.
-『숙종실록』 숙종 18년(1692) 12월 20일
“신에게 자식 하나가 있는데 지금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내약방(內藥房)에 입직한 의원 조청(曺聽)에게 진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 『세종실록』 세종 1년(1419) 12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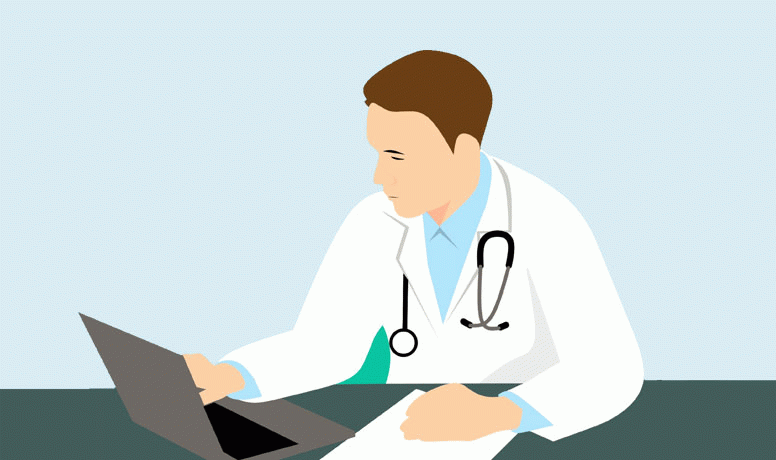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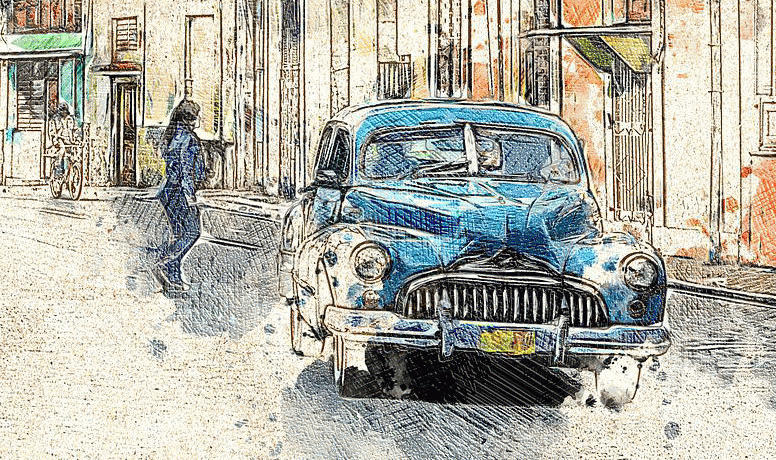



![[삼성전자 복지몰] <BR>6월 에어컨 페스티벌](http://softbook.co.kr/book/magazine/sm-content/upload/kbiz/magazine/62/1015/uti4_post_title.jpg)
![[롯데리조트] <BR>5~6월 프로모션 노란우산공제회](http://softbook.co.kr/book/magazine/sm-content/upload/kbiz/magazine/62/1013/uti4_post_title.jpg)
![[체크업플러스] <BR>무료 질병예측 서비스 이벤트](http://softbook.co.kr/book/magazine/sm-content/upload/kbiz/magazine/62/1016/uti4_post_title.jpg)
![[이수스마트치과] <BR>비보험 진료과목 할인혜택](http://softbook.co.kr/book/magazine/sm-content/upload/kbiz/magazine/62/1017/uti4_post_titl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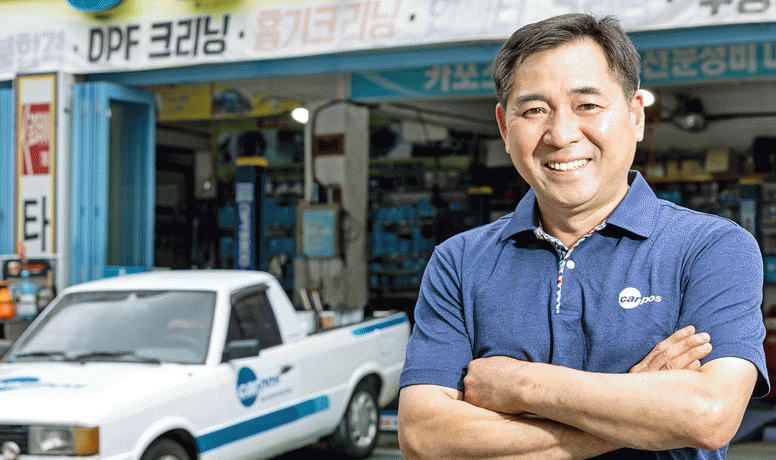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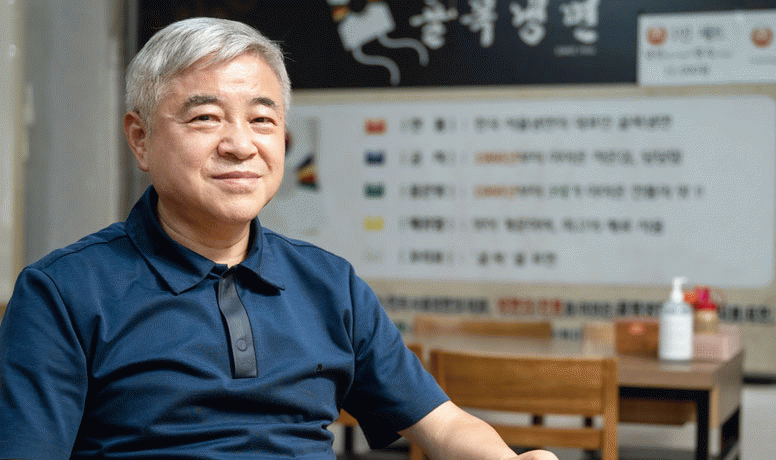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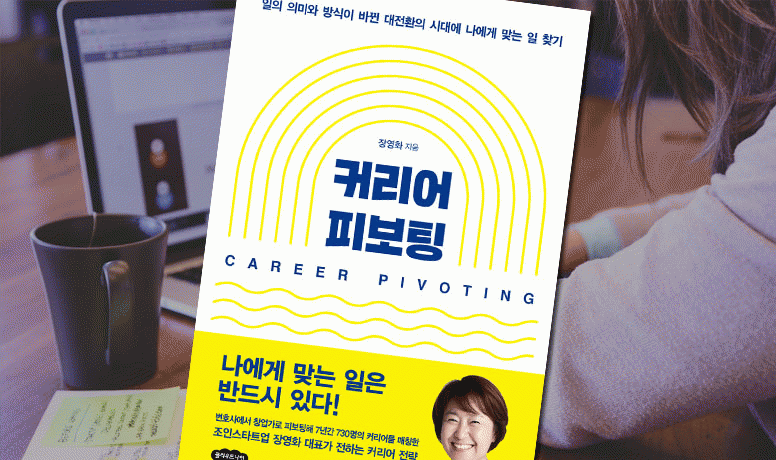
![노란우산과 떠나는 여행 [리솜리조트] <BR>노란우산공제 회원가족 이용](http://softbook.co.kr/book/magazine/sm-content/upload/kbiz/magazine/62/1019/uti4_post_title.jpg)






